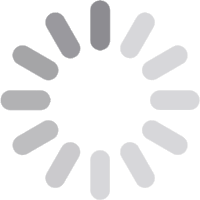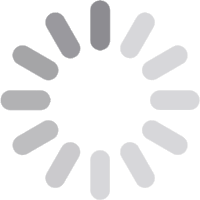종북도 친미도 아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인간의 행복에 필적할 만한 집단의 안녕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정의(正義)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나와 가정의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만큼, 내가 속한 회사와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길 꿈꾼다. 그게 더 보편화되면 세계 평화다.
그렇다면 평화와 정의, 행복 등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가치일까. 태평세대에 살면서도 남들과 비교해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소득격차와 같은 불평등을 체감하면서도 제 한 몸 배부르게 먹고, 잘 입고 산다는 이유로 행복감에 빠져 사는 누군가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내가 행복해야 남의 불행도 보이게 마련이다. 그 불행이 누군가 단지 운이 없거나 사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면, 즉 다 같이 노력해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절감한 뒤 비로소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공동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이다.
내 경우 솔직히 말하자면 ‘사회 정의’, ‘세계 평화’ 같은 거창한 개념들은 결국 나의 행복이 충족된 뒤에야 고민해볼 수 있고, 실천에 나설 엄두가 나는, 그런 문제들이다.
판사 문유석의 <개인주의자 선언>(2015)은 이처럼 당연하지만, 남들 앞에서 대놓고 떠들기엔 꺼려지기도 하는, 그런 선언인 셈이다. 그럴 법도 한 것이 흔히 객관화 된 표현으로 누군가를 ‘개인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배경엔 ‘이기주의자’라는 속뜻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문 판사가 대학시절을 보냈다는 ‘88학번’즈음엔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또 한편에선 민주화에 앞서 국가가 주도했던 산업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역자’ 낙인을 찍어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불행의 화근을 이 같은 집단의 폭력성에서 찾는다. 가학 성향의 스승으로부터 모멸감에 가까운 도제수업을 통해 1류 드럼 연주자로 거듭나는 서사인 영화 <위플래쉬>를 자기 계발로 받아들이는 도착된 우리 사회 청년들의 경쟁 심리. 유혹에 넘어가 평생 한 번의 실수로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인민재판식의 여론의 질타 속에서 최소한의 인강의 존엄마저 무시됐던 한 대학교수 부인(婦人)의 사례까지.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저자 자신이 판결하거나 목격했던 사건들, 비근한 우리 주변의 소재에서 집단은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만국의 개인주자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고 촉구한다. 왜? 행복해지 위해서.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지, 비합리성, 더 나아가 폭력성을 띠는 일들이 내 주변에선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다가 얼마 전 같은 부서 후배 기자가 겪은 일화가 떠올랐다.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는 나로선 ‘진영 논리’라는 집단의식의 어두운 측면이 씁쓸하게 다가던, “정말 싫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건이었다.
후배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취재팀에 차출됐다. 회담의 결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됐다는 브리핑이 있었던 9월 20일. 후배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이것이 미국과 먼저 협의가 됐는지, 그래서 혹시 서울에 왔을 때 종전선언을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러자 같은 날 한 방송국이 마련한 특집대담회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후배를 “젊은 기자”라고 지칭한 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합의했는데, 미국과 협의하고 한 것이냐고 묻더라(…)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남북 정상 간에 오가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자라니 큰일 났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이 비판을 위해 끌어들인 ‘트릭’은 후배가 질문에서 사용한 어휘인 ‘협조’를 ‘허락’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어느새 ‘미국과의 협의 여부’는 ‘트럼프의 허락을 받고 벌인 일이냐’는 질문으로 둔갑됐다.
그런데 둔갑은 정부 관계자로부터 똑같은 표현에 대해 정반대의 방향으로 재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0일 백악관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가능성’ 발언을 놓고 “그들은 우리 허락 없인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지적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된 ‘협의’는 ‘허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등장했던 ‘허락’은 ‘협의’로 각각 다르게 해석된 셈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후배는 ‘식민지근성’이라고 비판했다.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피식민지 의식 때문에 당당하게 임할 ‘협의’는 ‘허락’으로 굴절되고, 정작 강대국이 ‘허락’이란 단어를 택하자, ‘협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자위적인 오독을 하는 이른바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의 반응을 일단 제국주의의 발로라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은 반미(反美)주의의 산물은 아닐까. 나는 최근 남북의 대화국면에 대해 마치 뺑덕어멈처럼 ‘잘 안 되라’는 주문만을 외는 자유한국당의 반공(反共)주의, 상대를 종북(從北)으로 모는 색깔론 만큼이나 무조건적인 반미주의 역시 진영 논리, 집단의식에서 비롯되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사안을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논리로 재단하는 집단의식을 “좌우자판기”라고 비판한다.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상품을 내놓은 자판기처럼, 미리 찍어놓은 논리만을 무한반복 틀어대는 녹음기 같은 상투성(Cliche)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아닐까.
저자의 해법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라”는 것이다. 회사일수도 있고 정당일수도 있고, 남성이나 여성 같은 성별일 수도 있는 우리가 속한 집단.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편하게 통용되는 속설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믿는 개인주의.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