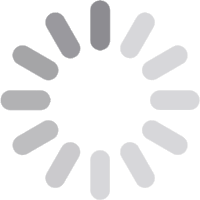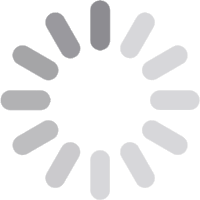기계의 문장, 인간의 자취
“쓰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행위다.” - 515쪽
일상의 인공지능은 수십 년간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의 전유물에 가까웠다.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내고 대화도 나누는 상상 속 존재였다. 영화 「인터스텔라」(2014)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 타스(TARS)와 케이스(CASE)가 그랬다. 「패신저스」(2016)의 안드로이드 바텐더 아서(Arthur)는 절망감에 빠진 인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때 먼 미래의 풍경으로 여겼던 인공지능의 일상화는 어느덧 현실이 되었다. 영화 속 인공지능이 계산을 빠르게 하거나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 책『쓰기의 미래』에서 저자 나오미 배런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글을 잘 쓴다면, 인간은 여전히 쓸 이유가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만고만한 인공지능 기술 소개서와 달리, 그녀는 ‘쓰기’라는 인간 고유의 정신 활동이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어떤 변형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파고든다. 인공지능은 ‘쓰기’를 자동화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며 창작의 경계까지 침투하고 있다. 창의성조차 알고리즘화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이 책의 원제인『Who wrote this?』는 존재론적 질문이다. ‘누가 썼는가’라는 물음은 곧 ‘왜 쓰는가’, ‘무엇을 써야 하는가’, ‘누가 쓴 것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일련의 철학적 성찰로 번져간다.
저자는 문해력의 역사, 쓰기 교육의 제도화, 기계번역의 진보 과정을 추적하며, ChatGPT 같은 언어 모델이 우리의 ‘쓰기 자아’를 서서히 잠식하는 모습을 예리하게 응시한다. 그 우려는 저작권이나 부정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인 느림, 반복, 고뇌, 재구성이 효율성의 논리 아래 침묵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결코 인공지능을 혐오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 숙고한다. 감각 없는 기계가 인간을 너무 닮아갈 때 발생하는 불쾌감(uncanny valley, 불쾌한 골짜기)은 언어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의 서사적 감각과 정서, 맥락의 복합성은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그럴듯함에 속아, 경험의 정수를 점점 더 무감각하게 흘려보내고 있다.
교육 현장은 특히 위태롭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문단과 문장으로 점철된 학생의 글은 사유의 결과물이 아닌 대체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단지 부정행위나 윤리 위반이 아니라, 학습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쓰기의 본질이 흐려지는 데 있다. 쓰기는 사고의 외연을 넓히고 자아를 탐구하는 통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유를 대체할 때, 우리는 점차 쓰기를 통한 ‘사고의 명료화’라는 근본적 가치를 서서히 잃게 된다. 쓰기 과정을 타자화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저자는 쓰기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도 끌어올린다. 표현의 자유, 학습권, 창작의 기쁨은 점차 ‘편의’라는 이름으로 위협받고 있다. 텍스트 생성이 간편해질수록 쓰기의 윤리와 주체성은 불투명해진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를 소비하지만, 그 이면의 알고리즘에는 무관심하고 알 길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가장 은밀한 자기 소외다. 이 책은 이런 위기를 이분법적으로 논파하거나 해법을 단순화하지 않는다. 윤리적 기술 설계, 언어 문화적 다양성, 쓰기의 교육 철학의 맥락 속에서 인공지능과의 공존의 조건을 모색한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여전히 인간일 수 있는가?
결국 이 책은 기술과 쓰기의 미래가 아닌 인간의 미래를 묻는 책이다. 쓰기는 더 이상 필수 노동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쓰기는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꿈꾸고 괴로워하는지를 가장 깊숙이 드러내는 실천이기도 하다. 이 책은 기술을 향한 찬양과 도덕적 비탄 사이에서, 우리가 멈춰 서야 할 경계의 선을 조심스레 그려낸다. 그 경계선 너머에 ‘쓰는 존재’로 남으려는 인간의 마지막 불빛이 아스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