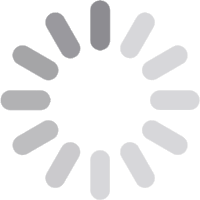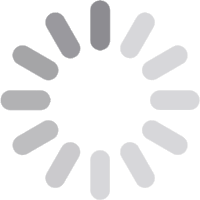한국 독립운동에 ‘국적’이라는 경계는 없다
“조국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 독립에 온몸을 던진 푸른 눈의 이방인, 고국 사람들에게 배신자 낙인이 찍히면서도 한국인 편에 서서 일제의 폭거에 맞서 싸운 일본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중국인을 오롯이 되살려내 기억해야 한다.” - 363쪽
한국 독립운동에 ‘국적’이라는 경계는 없다. 강국진․김승훈․한종수 3인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전현직 언론인인 저자들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투사들’ 25인의 생애와 활동을 충실하게 복원하였다. 이들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자르’를 추적하고, 역사학도로 되돌아가 오래된 역사서인 아리랑(김산, 님 웨일즈 저)과 백범일지(김구 저), 약산과 의열단(박태원 저) 등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렇게 구성한 25인의 이야기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치열했던 투쟁과 헌신, 그리고 수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한국 독립운동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직접 투쟁하거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25인의 외국인을 총 5부에 걸쳐 다룬다. 1부는 의열단과 임시정부를 지원한 이들과 사회주의 혁명가를, 2부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중국인 부인들과 일본인 스승을, 3부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품어 안은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대를 이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미국인을, 4부는 국내에서 한국의 비운적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이를 세계에 알린 언론인과 한국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증한 중국인․프랑스인․미국인을 소개한다. 이어서 5부는 3․1운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인과 영국인을 다루고 있다.
25인을 활동 무대별로 간략히 소개하자면, 먼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한 인물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의열단과 함께했던 영화적 인물인 헝가리인 마자르, 임시정부와 국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다 옥고를 치른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L. 쇼,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과 함께한 중국인 이숙진(리수전),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어 한중연대를 이룬 김성숙의 부인 두쥔훼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을 도운 조지 피치 일가,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쑨원, 장제스, 쑹메이링, 쑨커, 그리고 톈진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 교육가 장보링이 있다.
국내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사회주의 운동의 기수가 된 이소가야 스에지와 미야케 시카노스케, 식민지 교육의 모순에 저항한 죠코 요네타로, 온갖 비난에도 조선인 고아들을 품에 안은 소다 가이치, 한국 언론사의 또 하나의 기원을 이룬 어니스트 T. 베델, 대한제국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널리 세계에 알린 프레더릭 매켄지, 호머 B. 헐버트, 호러스 N. 알렌, 3․1운동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린 밸런타인 S. 매클래치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인보다 더 투쟁의 전면에 섰던 가네코 후미코와 후세 다쓰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한국 친우회가 결성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루이 마랭과 매켄지를 다룬다.
저자들은 역사의식과 기자정신으로 광복 80주년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하에 이 책을 쓴 듯싶다. 일반적인 역사 연구자라면 구성하기 힘들었을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 책에 담긴 이유이기도 하다. 끈질긴 질문과 노력 끝에 얻은 인물들의 생애를 현재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담았다. 덕분에 집필자도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던 이야기와 사실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상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애 마지막까지 한국을 아끼고 그리워한 그들을 우리는 그간 얼마나 기억해 왔던가, 그들은 어쩌면 또 다른 우리, 한국인이 아닌가.
3․1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작성한 글귀에는, ‘한국의 독립이 있어야 동양의 평화가 있고, 이로써 세계 평화의 진전을 이룬다’라는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결국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고 돕는다는 것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실천이었다.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25인의 ‘외국인’은 누구보다 투철한 인류애를 기반으로 한국의 독립에 이바지한 실천가이자 혁명가이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외국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들도 지적했듯이, 이제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80여 명을 넘어 수십 또는 수백 배의 사람들이 더 있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