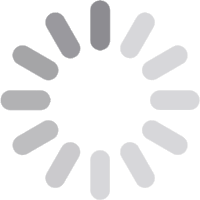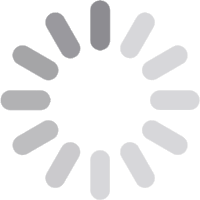기후 위기와 메가파이어의 시대, 한국의 산림 및 도시계획과 기후 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향
“한쪽에서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기술이 생태계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연이 자발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상에 의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메가파이어의 확산과 기후 이상의 악화를 제한하기 위한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 98쪽
이 책은 점점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산불의 이면에 어떤 구조적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저자는 메가파이어(Megafire)라 불리는 대형산불을 단지 자연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든가, 기후 위기의 불가피한 결과, 혹은 인간의 일시적 실수로만 보지 않는다. 산불을 우리 사회와 문명이 자연과 맺어온 관계의 반영, 즉 문명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는 징후로 이해한다. 이 책은 자연재해를 넘어선 ‘사회재난’으로서의 산불을 언급하며, 그 배경에 주목한다.
기후변화는 산불의 빈도를 높이고 그 규모를 전례 없이 확대하고 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길어지고, 강수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숲은 점점 더 마른 불쏘시개처럼 변해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자연 기후 현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도시화, 산림 정책, 인구 분포, 에너지 인프라, 농업·관광지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는 복합 재난(compound disaster)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팽창은 사람과 불의 거리를 좁힌다. 산림 정책 역시 경제성 중심의 단일 수종(樹種) 조림(造林), 유지·관리 부족, 자연적인 산불 주기 차단 등으로 숲의 자정(自淨) 능력을 약화해 왔다. 기후가 점점 더 산불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사회는 오히려 산불 발생의 구조적 조건을 강화해 온 셈이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 활동이 서로 맞물려 재난의 강도와 영향 범위를 키우는 구조는 오늘날 많은 재난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특히 우리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한다. 인간이 산불을 진압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회적 구조 자체가 불을 부르고 있다. 산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한 위험인 것이다.
우리나라 사례도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주도의 조림 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푸른 산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일 수종 중심의 식재로 이는 외래종의 도입, 급경사지에의 조림 등과 함께 생태계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산지는 주거지와 맞닿은 공간이 되었고, 이는 도시와 산림의 접경지대를 위험지대로 만든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기존의 도시 구조와 생태계 관리 방식이 지닌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과거의 전통적 산림 이용 방식은 지금과는 달랐다. 일례로 화전(火田) 농업은 일정한 주기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뤄졌기에 숲의 회복이 가능했고, 인간과 숲 사이의 물리적·생태적 ‘거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숲과 너무 가까워졌고, 그 경계는 모호해졌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을 전체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저자는 산불을 ‘재난’이 아닌 ‘시스템의 반영’으로 본다. 도시를 설계하고 국토를 이용할 때는 적어도 수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함에도, 현실은 단기적인 개발 논리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고, 기후 적응성과 회복 탄력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산불은 단순히 불길의 문제가 아니며, 기술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불타는 숲’ 그 너머를 보게 한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연과의 거리, 생태적 균형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시간 감각을 다시 되짚어 보게 한다. 산불이라는 재난을 계기로 우리가 인간과 자연,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것을 강조한다. 기후 위기 시대, 숲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를 묻는 거울이며,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현실의 상징이다.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불길이 아니라, 그 불을 가능케 한 ‘문명’의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