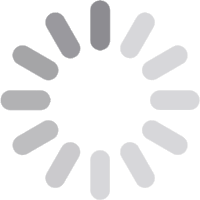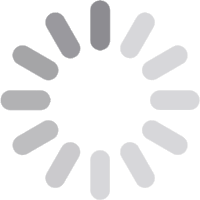평등은 왜 사회적이어야 하는가
“부와 재산의 소유권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삶과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협상력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나 빚만 지고 있다면, 어떤 노동 조건이나 임금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 149쪽
국제적으로 공정성의 이슈를 확산시킨 저서 21세기 자본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 ‘공정성 이론’의 대가인 두 학자가 만나 나눈 이야기들에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그 결과물이 비교적 가벼운 대담집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적당한 책의 두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어볼 용기를 내게 만든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의 첫 장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단순히 두 학자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풀어놓은 대담집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물들이 서로 마주치는 두물머리와도 같은 저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간 연구해 온 여정과 현재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정성’ 담론의 흐름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람이 이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 혹은 ‘평등’의 문제를, ‘시장에 갇힌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1시간을 일해 8천 원을 받았고, 내 친구도 1시간을 일해 동일하게 8천 원을 받았다면 이 둘은 평등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두 노동자 간에 평등이 이루어졌다면 ‘두 사람’ 혹은 ‘회사’라는 공간에 한정된 지엽적 범위에서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으로 10,03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합의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의 최소량, 혹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노동의 최소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8,000원을 받은 두 사람 간 보수는 평등하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공정한 보수인 것이다. 즉, 어떤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반영되어야만 한다.
두 학자가 이 책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보수의 분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들이 자유주의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다양성과 경쟁을 통해 번영을 이끄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체성과 통합을 가져다주는 ‘국가주의’, 부의 재분배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 축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분배’에 관한 논의가 ‘국가주의’나 ‘사회주의’적 논의는 사라진 채 ‘자유주의’적 관점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까지 균형을 이루던 이들 세 축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주의가 약화되면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만이 홀로 남게 되었고, 그 결과 축의 균형을 잃게 되었다. 두 저자는 이 같은 큰 흐름에 따라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적 테두리 내에서 정체성 문제 등은 사라지고, 모든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성과에 따라 사회적 성취가 결정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다. 저자들이 보기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그동안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그들의 유권자들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공고화 시켜온 탓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및 유럽의 최근 투표에서 보수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지역을 보면 주로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들인데, 이는 제조업의 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금융 산업을 옹호하며, 전 지구적으로 제조업의 이동을 부추긴 정치적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이 기존의 진보주의적 정치세력인 민주당이라고 유권자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반사이득을 얻은 것이 바로 트럼프의 부상이다.
그러나 두 저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피케티는 100년, 200년 전에 비해 ‘평등’의 사상이 국제적으로 대약진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를 위해 우리가 해결하고 노력해야 할 당면 문제들이 놓여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