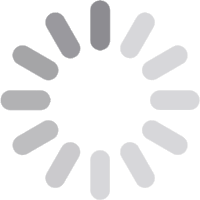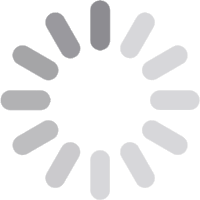법을 넘어, 시민의 약속으로 만드는 민주주의
“우리는 법과 헌법이 좋은 삶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102쪽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248쪽
이 책의 제목은『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이지만, 독자들에게는 본문을 읽기 전 원제인 『How to be a citizen : learning to be civil without the state』를 확인하기를 권한다. 저자 신디 L. 스캐치(Cindy L. Skach)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헌법이나 더 많은 법이 아니라, 강제적 규칙 없이도 협력을 작동시키는 시민성의 학습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핵심 주장은 원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에서 저자는 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을 정리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25쪽)라고 진단하면서, 원인이 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있다고 짚는다. 법은 책임을 외주하게 만들고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길들인다. 저자는 법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는 규칙일 뿐임에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해야 할 일(협력과 책임)을 법원에 온전히 맡긴 결과, 자율적 공동체가 쇠약해지고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제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은 제1부에서 정리한 법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수칙을 제시한다. 첫째, 선출된 지도자라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탈중앙적이고 수평적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아닌 시민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셋째, 물리적 공간에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식량, 환경, 돌봄 등 삶의 기반이 되는 문제들을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동체에서 다시 세우고 구성원 간 관계와 기억을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타문화에 대한 상호 관심과 접촉을 통해 경계를 건너는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진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수칙을 내면화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국가와 권력, 헌법과 법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구성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 곧 시민 복종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법치만으로는 협력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시민들이 서로 숙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공동체 단위로 공유하는 정보 혹은 가치를 복원하자고 강변한다.
이 책은 최근 화두인 ‘민주주의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 논의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배치한다. 기존 논의가 제도 간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둔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이나 정부와 시민 간 관계에 초점을 둔 수직적 책임성(vertical accountability)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책은 ‘시민성’으로 논의를 이동시킨다. 저자가 말하는 ‘시민성’이란 외부 규칙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화된 덕성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 시민의 능력이다. 저자는 지역, 돌봄, 교육 현장의 구체적 사례와 사회적 자본 연구를 통해 법이 승패를 가를 때, 공동체의 장인 광장은 협력의 토대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시민성의 회복과 학습에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퇴행’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 ‘법의 그림자에서 시민을 다시 호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진단에 대한 해법의 상당 부분이 결국 ‘교육’으로 환원되는 점은 아쉽다. 교실과 광장이 공고화된 권력구조를 직접적으로 혹은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시민도 변해야 하지만, 변화를 지지하는 제도적 다리(bridging institutions)가 함께 놓일 때 교육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생활권 단위의 공공 정보 인프라, 시간권 보장, 추첨 시민의회와 같은 작은 제도 혁신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이 요구하는 결단, “국가 없이도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의 습관으로 만드는 일은 분명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일독을 권한다.